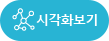| 항목 ID | GC06501352 |
|---|---|
| 한자 | -魂-崔北 |
| 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 집필자 | 김영미 |
[정의]
조선 후기 무주 출신의 화가 최북의 그림과 일화.
[개설]
최북(崔北)[1713?~1786?]은 조선 숙종(肅宗), 영조(英祖) 때의 화가이다. 초명은 최식(崔埴), 자는 성기(聖器)·유용(有用), 호는 칠칠(七七)·월성(月城)·성재(星齋)·기암(箕庵)·거기재(居基齋)·삼기재(三奇齋)·호생관(毫生館)이다. 호의 하나인 ‘칠칠(七七)’은 자신의 이름인 북(北) 자를 반으로 쪼개어서 만들었으며, 붓[毫] 하나로 먹고산다[生]고 하여 ‘호생관(毫生館)’이라고도 하였다.
[무주 사람 최북의 생애와 교우 관계]
최북은 경주 최씨(慶州崔氏)로 알려져 있지만 스스로 자신은 무주인(茂朱人)이라고 말하였다고 전한다. 무주인이라는 기록은 무주 군수 조병유(趙秉瑜)가 발의하여 편찬을 시작한 무주 읍지인 『적성지(赤城誌)』, 장지연(張志淵)의 『진휘속고(震彙續考)』와 『일사유사(逸士遺事)』, 오세창(吳世昌)의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최완수의 『화가약』 등 여러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최북의 생애와 관련해 현전하는 문헌 기록이나 사료는 영성한 편이라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생애를 고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면 최북은 무주에서 활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개략적으로 최북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북의 유년기나 청년기까지의 성장 과정이나 시(詩)·서(書)·화(畫)의 습득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다. 30대는 그가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잦은 여행으로 객지에서 지낼 때가 많았고, 기행과 사생을 통해 자신의 회화 세계를 성립한 시기이다. 특히 무진년인 1748년(영조 24) 통신사(通信使)의 수행원 자격으로 당시 수행 화원 이성린(李聖麟)[1718~1777]과 함께 동행하였고, 6개월간 일본에서 활동하였다. 최북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도 다녀온 것으로 추측된다. 신광하(申光河)[1729~1796]가 지은 「최북가(崔北歌)」를 보면 만주 벌판 너머 흑룡강(黑龍江)까지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최북의 40, 50대는 단양, 금강산 등 국내의 명승지를 찾아 여행하였던 시기였다. 기사년인 1749년 당시 유명한 서예가인 도보(道甫) 이광사(李匡師)[1705~1777]와 함께 단양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그린 「단구승유도(丹丘勝遊圖)」가 전한다. 또 금강산을 그린 그림으로 1755년(영조 31)의 「금강산전도(金剛山全圖)」와 「표훈사도(表訓寺圖)」 등이 있다. 최북은 이 시기 조선의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진경산수화를 그리며 남종 문인화풍을 추구하고, 미법(米法)을 애호하여 미법 산수화를 그렸다. 궁핍한 삶 속에서도 화가로서 작품 제작에 열의를 보였다.
최북의 말년은 개성을 한껏 드러낸 시기이다. 후기 작품으로는 「관폭도(觀瀑圖)」와 같은 산수 인물화가 있으며, 「지두해도(指頭蟹圖)」, 『사시팔경도첩(四時八景圖帖)』, 「고산구곡도(高山九曲圖)」 등의 작품이 주목받고 있다. 최북은 후기 회화에서 주로 탈속적 소재를 취하였다.
최북의 죽음에 대해서는 남공철(南公轍)의 「최칠칠전」 맨 마지막에 “칠칠이는 서울 여관에서 죽었는데, 그해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으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이규상은 “늙어서 남의 집에서 기식하다 죽었다.”고 하였다. 조희룡(趙熙龍)은 “칠칠이는 49세에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칠칠 49라는 숫자의 예언이라 하였다.”고 「최북전」에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신광하가 최북의 죽음을 애도하여 쓴 「최북가」를 보면 “칠칠이가 어느 겨울날 술에 취해 돌아오는 길에 성벽 아래 잠들었는데 마침 폭설이 내려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고 하였다. 신광하가 이 시를 지은 것이 1786년(정조 10)이었다. 만약 이 시를 최북이 죽은 그해에 썼다면 최북이 죽은 것은 1786년, 그의 나이 75세가 되는 것이다. 물론 사망 연도가 그보다 앞설 여지도 있지만,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를 통해 1784년 작품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7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최북은 중인 출신으로, 사대부 중에서 예술을 아는 당대의 명사들과 교류가 많았다.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와 함께 놀면서 그림을 그렸고, 당대 최고의 시인 신광수(申光洙)[1712~1775]가 그의 그림 「설강도(雪江圖)」에 「최북 설강도가(崔北雪江圖歌)」라는 시를 지어 주기도 하였다. 또한 당대 재야의 최고 실학자로 유명한 성호(星湖) 이익(李瀷)[1681~1763]은 최북이 일본에 갈 때 송별 시를 지으며 헤어짐을 안타까워하였으니, 그 역시 최북을 아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대 예림의 총수였던 표암(豹庵) 강세황(姜世晃)[1713~1791]이 친구들과 사노회(四老會)를 결성하는 「아집도(雅集圖)」를 최북이 그려 주었다. 누구보다 최북과 친하게 지냈던 인물은 순조(純祖) 때 재상을 지낸 남공철(南公轍)[1760~1840]이다. 그는 최북의 전기[『금릉집』13, 「최칠칠전」]를 썼을 뿐 아니라 그와 어울려 놀면서 편지도 보냈던 것을 그의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북과 남다른 우정을 나눈 친구는 이단전(李亶佃)[?~1790]이었으며, 그 외에 이현환(李玄渙)[1713~1772]과도 우정을 나누었다.
[한국의 '빈센트 반 고흐' 최북이 남긴 광기의 일화들]
최북은 자신의 귀 일부를 자르는 광기를 보이며 개성적인 화풍을 구사했던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van Gogh)[1853~1890]와 비견된다. 최북 역시 예술가적인 광기로 자신의 눈을 스스로 찔러 애꾸눈이 되었다. 또한 여러 일화에서 보여 주는 호쾌한 기상은 그의 그림 속에 투영되어 있다. 몇몇 일화들을 살펴보자.
일화 1
어느 벼슬아치가 한 초라한 화가를 앞에 두고 꾸짖고 있었다. 내가 그림을 부탁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까지 붓끝 하나 놀리지 않았느냐는 둥,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토록 오만하느냐는 둥 별별 말로 겁을 주고 있었다. 이런 말을 듣던 화가는 벽력같이 화를 내며 옆에 놓여 있던 송곳을 들고 소리쳤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리는구나.”라며 들고 있던 송곳으로 자신의 한쪽 눈을 서슴없이 찔렀다. 눈에서 피가 철철 흐르자 그 벼슬아치는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떴다.[이이화, 「눈을 찌른 화가, 최북」]
최북이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찔러 애꾸눈이 된 이야기로, 우리나라 회화사를 통틀어 가장 광기 어린 화가로 단번에 등극한 일화이다. 최북과 관련한 많은 일화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졌고, 이러한 광기가 최북에게 한국의 ‘빈센트 반 고흐’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애꾸눈으로 늙어서는 한쪽만 안경을 끼고 화첩에 얼굴을 반쯤 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 그의 광기와 오기, 완세불공(玩世不恭)한 불같은 성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화 2
일찍이 최북이 어느 귀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 하인이 칠칠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미안해서 “최 직장(直長)[종 7품]이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최북이 화를 내며 “너는 어찌 나를 최 정승이라 하지 않고 직장이라 하느냐.”고 힐난하였다. 이에 하인이 웃으면서 “언제 정승이 되셨습니까?” 하고 반문하니 최북이 “그러면 내가 언제 직장이 된 적이 있었더냐? 기왕에 헛벼슬로 부를 바에야 어찌 정승이라 하지 않고 직장이라 하느냐?”라고 말하고는 주인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남공철, 「최칠칠전」]
칠칠이의 재치 있는 오기를 보여 주는 재미있는 일화이다. 최북의 이러한 광기나 오기에 한몫 단단히 한 것은 바로 술이었다. 최북은 술에 미친 ‘주광(酒狂)’이었다고 한다. 남공철의 「최칠칠전」에 의하면, “칠칠이는 하루에 언제나 5, 6되의 술을 마셨는데 시중의 여러 장사 아이가 술병을 들고 오면 칠칠이는 집 안의 책과 종이, 그리고 천을 끌어 내어 전부 털어 주고 사곤 하였다.”라고 하였다.
일화 3
어느 날 구룡연에 들어갔는데 그 경치가 사뭇 즐거워 술을 잔뜩 마시고 울다 웃다 하더니 이윽고 소리를 지르면서 “천하 명인 최북이는 마땅히 천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하고는 드디어 몸을 던져 못으로 뛰어내렸다. 마침 구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면하였다. 그래서 떠메다가 산 아래 반석에 내려놓으니 헐떡거리며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긴 휘파람을 부는데, 그 소리가 숲을 진동하여 까마귀들이 까악까악 울며 멀리 날아가 버렸다고 한다.
이 일화는 금강산(金剛山) 구룡연(九龍淵)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비로소 죽을 곳을 찾았다.’고 하며 뛰어들었다는 일화인데, 술을 잔뜩 마시고 한 기행이다. 보통 최북의 광기나 오기는 항상 술과 함께 드러나는데, 마지막 부분에 ‘긴 휘파람을 불었다’는 부분에서 그의 호쾌한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일화 4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 달라고 청하였는데, 최북이 산만 그리고 물을 그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물으니 최북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아, 종이 밖은 모두 물 아니오.”라고 하였다.
모두 그림에 대한 최북의 호쾌한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일화들이다. 이 외에도 최북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럿 전한다. 훗날 최북의 일화들은 당시 중인들이 쓴 여러 책에 그대로 옮겨졌는데, 조희룡(趙熙龍)[1789~1866]의 『호산외사(壺山外史)』, 유재건(劉在建)[1793~1880]의 『이향 견문록(里鄕見聞錄)』 등 몇몇 책에 실려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일화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일화 자체로 재미를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북이 비록 낮은 신분을 타고났지만 양반이나 귀인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했던 호쾌한 기상을 볼 수 있는 일화들이기 때문일 것이며, 바로 이러한 호쾌한 기상에서 독자들은 통쾌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북 미술관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림들]
현재 최북의 유작으로 전해지는 작품은 대략 100점 남짓 된다고 하는데, 그의 그림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무주군의 ‘최북 미술관(崔北美術館)’이다. 최북의 그림은 물론 ‘자신의 눈을 찌르는 광기 어린 성격’, ‘자살 소동을 벌였던 기상’, ‘그림 속의 산’과 ‘그림 밖의 물’을 볼 줄 알았던 호쾌한 태도까지 모두 무주 최북 미술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북의 여러 작품 중 특히 최북다운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공산무인도(空山無人圖)」,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을 살펴보자.
1. 「공산무인도」의 공(空)
‘공산 무인 수류 화개(空山無人水流花開)[빈 산에 사람은 없는데 물은 흐르고 꽃은 피네]’라는 구절과 함께 그려진 그림이다. 인적 없는 산길에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텅 빈 초가 정자만이 사람의 자취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텅 빈 정자에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오히려 상징적으로 어떤 은자 또는 도를 닦는 사람이 찾아올 가능성을 비워 두고 있는 셈이다. 텅 빈 정자 옆에 제멋대로 뻗어 있는 거친 나무 두 그루도 인상적이다. 최북은 여러 분야의 그림을 그렸지만 그중 산수화를 가장 잘 그렸다고 한다. 당대 문사들이 최북을 ‘최산수’라고 부를 정도로 산수화가 기이한 멋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중 평론가들이 가장 빼어난 작품으로 뽑는 것이 「공산무인도」이다. 미술 평론가이기도 한 유홍준은 “화면 오른편으로는 마른 나무와 초가 정자를 담묵의 필선으로 소략하게 묘사하였음에 반하여 왼편은 작은 폭포를 이룬 계곡을 겹쳐 바른 농묵과 그 위에 덧칠한 담청(淡靑)이 흔연한 조화를 이루어 여름날 계류에서 일어나는 물안개의 느낌까지 전해 준다. 이것이 바로 최북의 그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호쾌한 기상이다.”[유홍준의 『화인 열전』2]라고 하면서 「공산무인도」가 절묘한 먹빛의 구사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산은 구체적인 형상으로 그려져 있지 않지만 화면 가득 넉넉한 여백이 빈 산의 이미지를 잘 살려 준다. ‘빈 산’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 그림은 나무도 있고 산도 있지만 깊은 정적감이 돈다. 그러나 그 정적감이 쓸쓸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운치를 느끼게 하는 것은 그 고요함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 꽃이 피고 있는 자연의 소리가 콸콸, 툭툭 들릴 듯한 묘한 함축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소리가 없는 빈 산이기 때문에 물소리, 꽃이 피는 소리를 오히려 들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는 간명한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
2. 눈보라 치는 밤길 같은 인생-「풍설야귀인」
‘눈보라 치는 밤길을 뚫고 돌아오는 사람[風雪夜歸人]’이라는 뜻의 이 그림은 눈 덮인 뒷산, 거센 눈보라에 휘어져 뚝 부러질 듯한 나뭇가지, 동자와 지팡이 짚고 가는 노인, 때마침 나와 있는 검정 개의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그림은 붓이 아닌 손가락 혹은 손톱으로 찍어 그린 지두화(指頭畵)인데, 역시 평론가들이 최고로 뽑는 작품이다. 조선의 어떤 화가와도 다른 인상적인 먹 기운과 꿈틀거리는 형상들이 한 번 마주치면 잊어버리기 어렵게 만드는 작품이다.[이상국, 「개소리에 내몰리는 나그네 최북」] 어두운 밤, 노인과 어린아이가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옆을 지나, 낯선 이들을 경계하는 검둥개의 짖음을 뒤로하고 깊은 계곡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람은 작게 그려져 있다. 초가집과 넘어질 듯 불안한 싸리 담장은 물론 길옆의 마른 나무들 모두 뒤틀리고 기울어져 있다. 집 뒤에는 큰 벼랑이 있고 앞에는 개천이 보인다. 하늘 부분은 오히려 어둑하고 컴컴한데, 눈이 내린 산과 집들과 언 개천은 오히려 희다. 이 그림에서 문제적인 것은, 이 풍경 속 어린아이와 노인이 따뜻하게 쉴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풍설야귀인’은 당나라 시인 유장경(劉長卿)이 쓴 시 구절로, 유장경의 시는 마침내 집에 당도한 사람의 안도감을 담았다. 그러나 최북은 이 내용을 아직도 귀가하지 못한 채 눈보라 치는 밤길을 어느 집 개 짖는 소리에 쫓기듯 지나가는 나그네의 고달픈 모습으로 비틀었다. 평생 통째로 삼킬 듯한 눈보라 치는 인생이 바로 최북이 느끼는 현실일 수 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광기 가득한 화가의 헝클어지고 뒤틀리고 기울어져 가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무주에서 만나는 최북]
무주군에서 만나는 최북과 최북의 그림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먼저 최북은 진경산수 화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당시에는 중국 산수의 형세를 그린 그림을 선호하였는데 최북은 이를 비판하고 우리 산수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인식한 것이다. 이는 그의 기질에서도 드러난다. ‘칠칠’이나 ‘호생관’이라는 호에서 알 수 있듯 최북은 반항아적인 기질을 지닌 인물이었다. ‘야무지고 반듯하지 못하다.’는 뜻을 가진 ‘칠칠’, ‘붓으로 그림을 그려서 먹고산다’는 뜻의 ‘호생관’, 이 둘을 합치면 더욱더 상승 작용이 일어난다. ‘붓으로 그림이나 그려 먹고 사는 칠칠이!’ 그는 한낱 칠칠한 그림쟁이, 혹은 한낱 먹고살기 위해 그림이나 그리는 칠칠이일 수 있었지만 양반이나 귀인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한 개인의 굽힐 줄 모르는 기개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창조적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예술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북은 세상의 평가, 대중의 시선, 역사적 잣대, 시대적 관습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였기에 「공산무인도」, 「풍설야귀인」 같은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최북은 무주 지역과의 관련성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 인물이다. 무주 출신 최북의 그림 세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2012년 6월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46[당산리 918-3]에 최북 미술관이 개관하였다. 이후 최북의 회화 세계는 무주 반딧불 축제 기간 등을 통해 무주 군민들에게 더욱 대중적으로 가까이 다가가 동양화를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의 그림을 무주에서 만날 수 있게 되면서 무주 지역민은 진경산수 화가를 배출한 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최북의 호쾌한 기상을 눈으로, 손으로 느끼며 문화적 소외에서 벗어나고 있다.
- 유홍준, 『화인 열전』2(역사 비평, 2001)
- 이이화, 「눈을 찌른 화가, 최북」(『길을 찾는 사람들』92, 사회 평론, 1992)
- 조민환, 「철학으로 읽는 옛 그림(6): 호생관 최북의 공산 무인도」(『선비 문화』11, 남명학 연구소, 2007)
- 변혜원, 「호생관 최북의 생애와 회화 세계 연구」(『고려 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고려 대학교, 2008)
- 「(호생관) 최북: 탄신 30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 전주 박물관, 2012)
- 구숙희, 「호생관 최북의 회화 세계 연구」(『수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수원 대학교, 2013)
- 이상국, 「개소리에 내몰리는 나그네 최북」(『아시아 경제』, 2015. 9. 18.)
- 김환태 문학관&최북 미술관(http://tour.muju.go.kr/art/index.do)
- 한국 고전 종합 DB(http://db.itk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