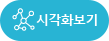| 항목 ID | GC03401022 |
|---|---|
| 한자 | 雙溪寺-千年- |
| 영어의미역 | Ssanggyesa Manger is Made of a Thousand Years Old Goribi Sari Wood |
| 이칭/별칭 | 「숙재 고리비 사리나무의 향방」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
| 유형 | 작품/설화 |
| 지역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
| 집필자 | 한양하 |
| 수록|간행 시기/일시 | 2005년 |
|---|---|
| 관련 지명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
| 채록지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
| 성격 | 전설|구유유래담 |
| 주요 등장 인물 | 도삼|거구 청년|숙재 사람들 |
| 모티프 유형 | 빈대 때문에 망한 절터|쌍계사 구유가 된 고리비사리나무 둥치 |
[정의]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에서 쌍계사 구유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개설]
「쌍계사 구유는 천년된 고리비 사리나무」는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숙재마을에 위치한 절에 도삼이라는 스님이 커다란 고리비사리나무를 키우고 있었는데 빈대가 들끓어서 절은 망하였고, 폐허가 된 절터의 잿길에 쓰러져 있던 고리비사리나무의 나무둥치는 쌍계사의 나무 구유가 되었다는 유래담이다.
[채록/수집 상황]
2004년 하동군 각지에서 채록·수집한 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하동향토사연구위원회가 집필하여 2005년 하동문화원에서 발행한 『하동의 구전설화』의 249~254쪽에 실려 있다. 「쌍계사 구유는 천년된 고리비 사리나무」는 횡천면 조사위원 박현기와 이병문 등이 현지에서 숙재 신경덕이 들려준 이야기를 채록한 것이다.
[내용]
1. 빈대로 폐허가 된 사찰
옛 마을 앞 산허리에 천년 묵은 희귀수(稀貴樹)가 대찰(大刹)의 함지박이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두둥재에서 성기등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 아래에 절골이 있다. 절간 뒷산으로 산림이 우거졌지만 비사리나무도 산재하고, 특히 천년이 넘은 고리비사리나무 한 그루가 다 큰 몸매로 골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 사리나무는 2m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
그 절골에 외로운 남자 ‘도삼’이라는 중 한 사람이 절을 짓고 살았는데, 절을 지을 때 그 고리비사리나무가 엄청나게 커 있었으니 함부로 거동할 수 없는 신령지임을 각성하고 절터를 닦았다. 도삼 승은 또 위쪽 옹달샘을 하나 파서 식수로 썼다. 샘물을 길어 먹고는 큰 돌로 덮어 두는 것이었다. 그 물을 마시고 살아온 도삼 승은 힘이 세고 체구도 비상히 컸다고 했다. 후일 사람들이 도삼이 뚜껑을 닫아둔 그 우물을 찾으려고 사방을 뒤져도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 절은 방장산(方丈山) 장엄한 줄기 흐름에 영천이 솟고 큰 고리비사리나무가 서 있는 곁에서 번창일로였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빈대가 생겨서 해가 갈수록 빈대 구덕이 되어갔다. 걷잡을 수 없는 빈대와의 전쟁에서 도삼이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절간 문을 닫고 샘 뚜껑도 닫고 고리비사리나무의 슬하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절의 산과 재산은 모두 흥청망청되어 버리고, 그는 청암골 어느 절간으로 옮겨 갔다가 마지막으로 쌍계사로 귀의하였다고 하나 그 뒷소문은 알 수 없다.
2. 쌍계사 구유가 된 고리비사리나무
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망해 버린 절터를 둘러보니 절터도 폐허가 되어 있었다. 수백 수천 년 된 고목이 절골에서 마을을 지켜 주던 배경이었는데 어느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으니 온 동네가 들썩하여 일어서 그 나무 둥치의 행방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그때 사상골 성기등의 일천봉 봉우리 위에서 내린 다른 자락에 한 청년이 살았는데 그는 산삼 뿌리 스친 물을 일상 먹고 자랐다는 소문난 거구의 사내였다. 그를 마을 거사의 선봉으로 내세워 산등성이에 당도하니 거창한 나무둥치가 육중하게 누워 있었다. 장정 대여섯 아름의 둘레에 열 길이나 될 길이의 고리비사리나무의 재단된 둥치였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동네 안으로 메고 가기로 결정하고 많은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 다시 오기로 했다. 동네에서는 이 거목을 운반할 의논에 열중하였으나 뾰족한 방안이 서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동네 사람들은 사리목이 궁금하여 수름재에 다시 가 보았다. 그런데 그 나무둥치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어렴풋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지금부터 대략 700~800년 전 고려 말에 쌍계사를 다녀온 사람들의 말이 “쌍계사 대웅전 큰부처 좌상 뒷마루에 눕혀져 있는 나무 구유! 그놈 커드라야!” 하고 감탄들을 하는 것이 이구동성이었다. 그래서 재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정밀히 살펴보니 사리나무 구유! 옛날 숙재 절골에서 잃어버렸던 그 고리비사리나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런 나무가 이 세상에서 생장되었던 곳이 숙재 절골 밖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화개면 범왕리 칠불사 뒷산에도 고리비사리대가 자생하고 있는 것이 산견(散見)된다고는 하지만 숙재 절골 고리비사리나무처럼 커다란 신비목이 있었더라는 전설은 들어보지 못했으니 말이다. 절골의 장군수 우물물을 마시고 살았던 도삼이 쌍계사로 귀의하였을 때 절의 절간을 지켜 주던 천 년 묵은 보배목을 기증하였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숙재 절골의 고리비사리나무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모티프 분석]
「쌍계사 구유는 천년된 고리비 사리나무」의 주요 모티프는 ‘빈대 때문에 망한 절터’, ‘쌍계사 구유가 된 고리비사리나무 둥치’ 등이다. 민간 신앙에는 바위나 나무 같은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의식들이 많다. 그 가운데 마을을 지켜 주는 큰 당산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신성하게 여겼으며, 성황당을 지어 제를 올렸다. ‘당나무’라 일컬어지면서 동제와 마을 굿의 대상으로 신체(神體) 노릇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동구나무가 언제 무슨 일로 화를 내어 사람들에게 징벌을 주었고, 앞날의 어떤 일을 예언하여 울었다는 사실 등을 자세히 알고 있다. 액운이 닥칠 기미가 있으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서까지 그 조짐을 알려 주기까지 한다. 이렇게 민간 신앙으로 전승되는 나무에 대한 자료는 옛이야기에서 풍부하게 드러난다.
또한 사람들은 풀이나 나무가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자라는 것을 통해 생명의 기원을 인식하고, 사람들도 땅으로부터 솟아나왔다는 용출(湧出) 화소의 신화를 생성·전승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동서양의 문화권에서 두루 공통으로 나타난다.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신단수나 「김알지설화」의 계림에서 알 수 있다.
「쌍계사 구유는 천년된 고리비 사리나무」에서 고리비사리나무는 나무의 특성상 2m를 자라지 않는 나무인데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절간의 뒷산에 있는 고리비사리나무는 천 년이 넘은 나무로 장정 대여섯이 안아도 안을 수 없을 만큼 둥치가 큰 나무였다. 이는 나무의 신성성을 드러낸다. 나무의 특성과 나이, 둥치에서 신비함을 가진 나무이기에 절골을 신성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고리비사리나무에 빈대가 끓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은 절골의 기운이 다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무에 욕심을 내어 나무를 옮긴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발적으로 절골을 떠났고, 수름재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지만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나무가 선택한 곳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고리비사리나무는 화개 쌍계사의 구유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절골에서 마을 사람들의 신앙이 약해지자 쌍계사로 가서 부처님의 은덕을 바라는 민중들에게 밥을 먹이는 구유가 되기로 한 것이다.
-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공저, 『구비문학개설』(일조각, 2004)
- 하동향토사연구위원회 편, 『하동의 구전설화』(하동문화원, 2005)
-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나무의 생명성과 그 조형물」(『비교민속학』4, 비교민속학회, 1989)